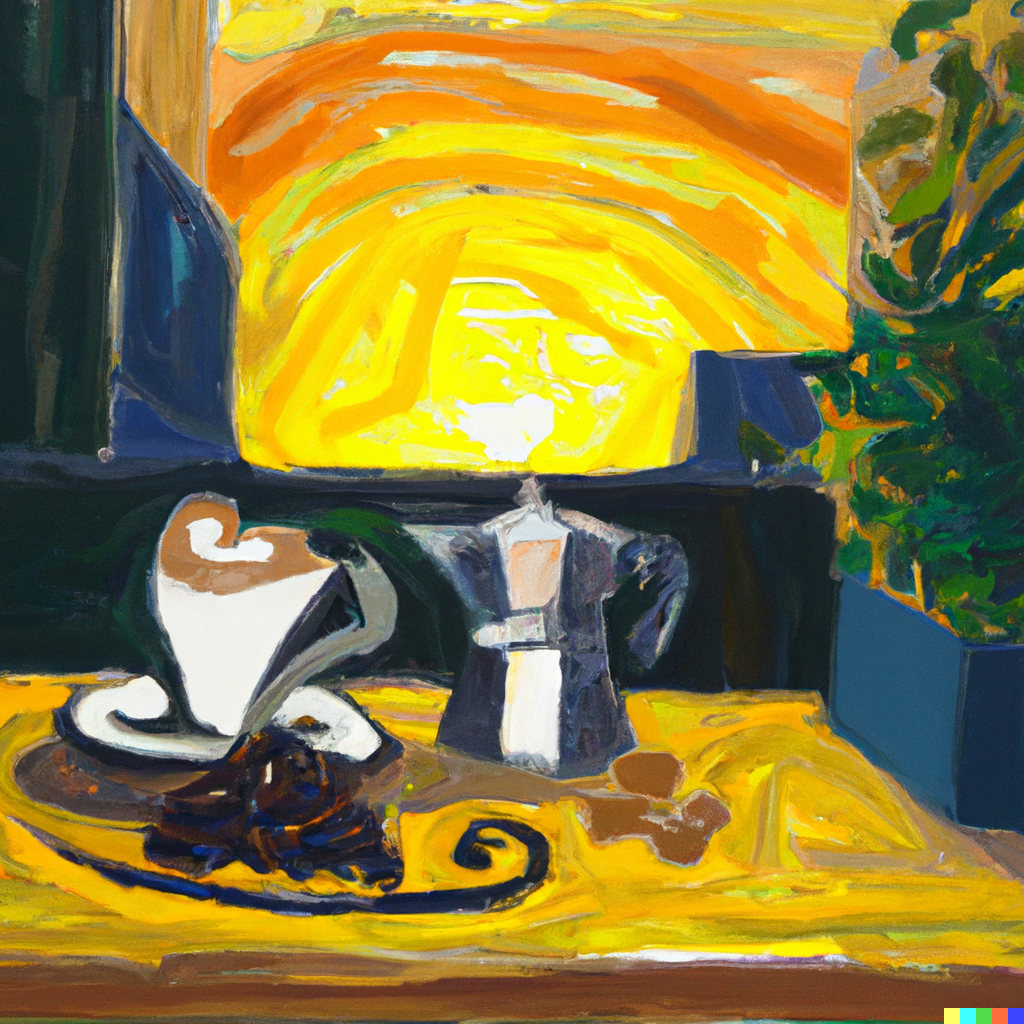개인 적 호불호를 떠나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17'은 매우 깊은 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봉준호의 영화가 갖는 세계관과 근본적 질문, 그리고 위트는 인정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 미키가 다시 탄생을 반복함으로써 죽기 전의 미키와 똑같다는 설정에 오래된 철학적, 과학적 논제를 꺼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키 17을 통해 오래된 논쟁을 떠올려봅니다.
태세우스의 배 논쟁
'태세우스 배'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의미를 이해하기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https://brunch.co.kr/@kwansooko/588
개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테세우스의 역설'
‘테세우스의 역설’, 혹은 ‘테세우스의 배’란 게 있다. 테세우스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이다. 그는 크레타 섬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후 배를 타고 에테네로 귀환했다(이 과정에서 많은
brunch.co.kr
인격동일성
세포의 조합과 끝없는 재생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인 나! 십 년 전의 나는 과연 나인가? 보통의 질문에서 신체를 유지해도 기억이 소멸되면 그것은 나인가? 영화 속에서 미키는 똑같은 복제의 신체에 기억까지 그대로 이전한 것이라면 미키 17과 18은 동일인인가? 역시 태시우스의 배처럼 단순할 수 없습니다. 물질과는 다른 사고와 정체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말이지요.


위의 마이클 잭슨은 흑인과 백인을 혼동할만한 변화에도 그는 여전히 마이클잭슨입니다.
그럼 미키 17과 미키 18 동일인인가요?
다시 혼란이 옵니다.
태시우스의 배 &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간 비교
테세우스의 배 논쟁은 정체성과 존재의 본질에 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논쟁이 시사하는 주요 철학적 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체성의 본질
테세우스의 배 역설은 사물의 정체성이 시간이 지나고 변화가 일어나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부분이 교체된 배를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정체성의 기준과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변화와 지속성
이 논쟁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어떤 것의 본질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촉발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무언가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하는 기준에 대해 고민하게 합니다.
형상과 물질의 관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개념과 로크의 물질적 연속성 기준은 이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형상'인지, 아니면 물질적 연속성인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존재론적 문제
피터 반 인와겐의 주장처럼, 이 논쟁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사물'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생명체를 제외한 물질적 대상들의 실재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식론과 관점의 중요성
테세우스의 배 논쟁은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논제들은 단순히 고대의 역설에 그치지 않고, 현대의 다양한 문제들(예: 성정체성, 인공지능의 정체성, 문화재의 진정성 등)에도 적용되어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할 것 같습니다.
논제의 대상이 된 배처럼 물질이 아닌 사람처럼 세포가 변하고 성장하고 노화하는 인간에게 나라는 정체성의 의미는 태세우스의 배 논리와 연결하여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테세우스의 배 논쟁은 인간 정체성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신체 세포가 지속적으로 교체되더라도 정체성을 유지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철학적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스 ㅂ니다.
생명체의 정체성 특수성
인간은 테세우스의 배와 달리 생명체로써의 고유한 연속성을 지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形相)' 개념에 따르면, 세포 교체라는 물질적 변화 속에서도 신체의 기능적 구조와 생명 활동의 패턴이 유지되는 한 동일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는 생명 현상이 단순한 물질적 조합을 넘어 체계적 조직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억과 경험의 누적적 연속성
존 로크의 정체성 이론은 의식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신체 구성 요소가 완전히 바뀌더라도 과거 경험과 현재 의식을 연결하는 기억의 사슬이 존재할 경우, 개인은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7년 전의 세포와 현재 세포가 완전히 달라도 유년기 추억을 기억하는 '나'는 연속성을 갖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맥락적 고정
정체성은 관계적 맥락에서 재구성됩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역할(부모, 직업)과(부모,직업) 문화적 정체성은 물질적 변화를 초월하여 지속됩니다. 이는 테세우스의 배가 단순한 물체인 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
법인류학자 수 블랙(Sue Black)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 조직이 98% 교체되더라도 생체 역학적 패턴(걸음걸이, 지문)과 유전 정보의 불변성이 정체성 인식의 근거가 됩니다. DNA는 테세우스의 배에 없는 생물학적 '설계도' 역할을 하며, 이는 형이상학적 형상 개념과 유사합니다.
정체성의 역동적 재구성
인간 정체성은 테세우스의 배와 달리 능동적 변화를 수용합니다. 청소년기 성장, 직업 변경, 가치관 변화 등에서 보이듯, 개인은 의식적 선택을 통해 정체성을 재정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적 변화는 오히려 자아 발전의 매개체가 됩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물질적 구성요소의 교체를 넘어, 인간 정체성이 생물학적 체계성, 의식적 연속성, 사회적 상호작용의 삼중 구조 위에 구축됨을 시사합니다.
테세우스의 배가 제기한 정체성 문제는 인간에게서 더 복합적인 층위의 사고와 답변을 요구하며, 이는 과학과 철학의 교차점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될 과제입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일상 > 취미는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의 실체 (3) | 2025.03.28 |
|---|---|
| '아포페니아'를 꼬집은 류준열, 신현빈, 신민재 주연, 연상호 감독의 영화 '계시록(Revelation)' (0) | 2025.03.26 |
| 막스 뤼셔의 색채심리학 (8가지 색의 선호도로 알아보는 심리 상태) (3) | 2025.03.24 |
| 성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7) | 2025.03.23 |
| 대사관 & 영사관의 차이 (0) |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