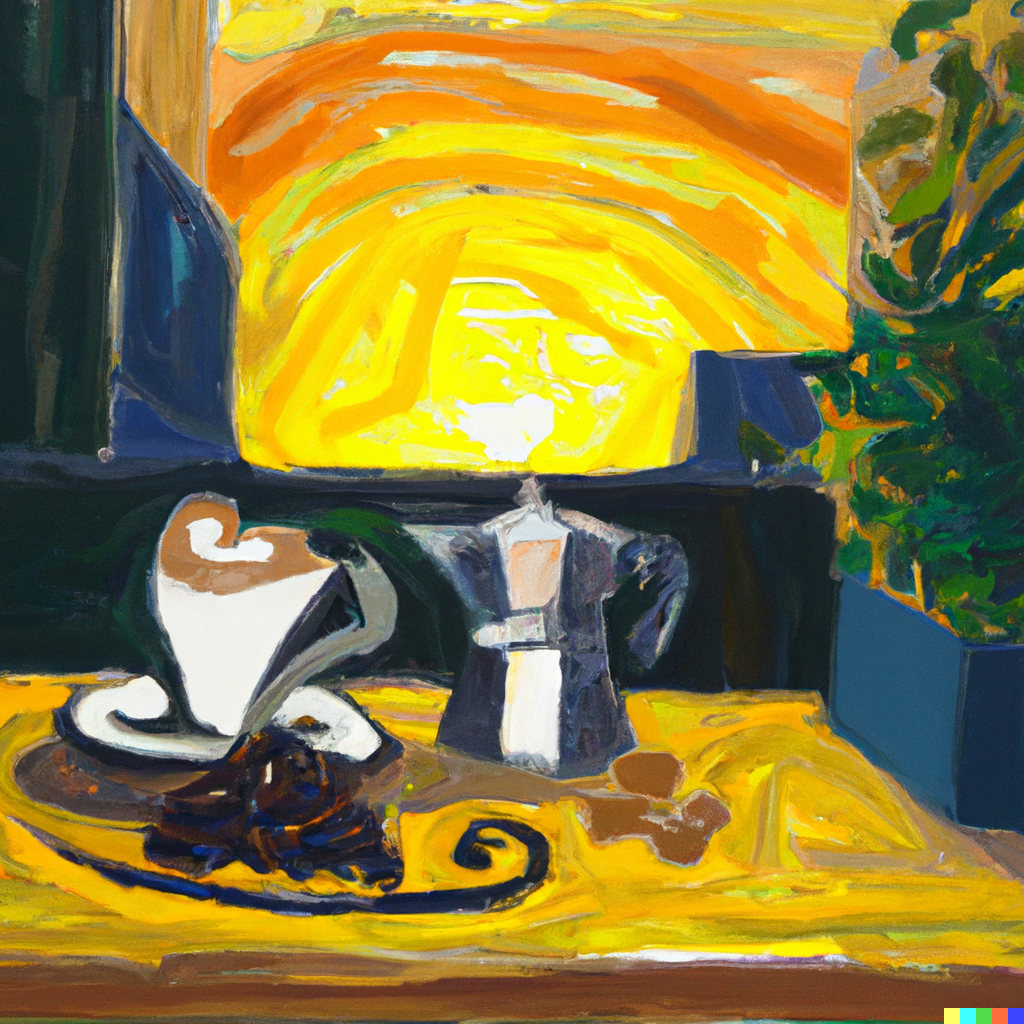저출산,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일상에서 체험된다. 동네를 걷다 보면 아이들 보기가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낀다. 공원에는 노는 아이들보다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아이를 낳게 만들려는 정부 정책들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더러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발언들도 있다. 2022년 0.78명의 출산율을 두고 일반 시민들도 인구변동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술자리에서 각각의 대책묘수를 던져보기도 한다.
이러한 뉴스와 사담들 가운데 출산율과 출생률이 혼동되어 쓰이기에 알아보았다.
출산율
가임여성(15세~49세) 1명이 평생낳는 아이의 수로 정의 한다.
출생률
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아이의 수
둘다 심각하지만 0.78이라는 놀라운 숫자는 출산율이란 걸 알 수 있다. 한 해 출생률은 도시 농촌 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인구를 구성하는 남녀의 비율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럼 출산율이 이토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고도 산업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나라에서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경제적 성취가 인생의 면모를 결정하는 고도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취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를 포함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서울대 인류학과 박한선 교수는 경제가 삶의 전반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현대고도산업사회에서 '번식' 즉 '출산'은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는 비합리적 선택이라고까지 말한다.
KDI연중기획- 인구감소


서울대 인구정책 센터장인 조영태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로 지적하기도 한다. 당시엔 지금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당장의 출산율을 두고 보면 우리나라만이 가장 심각한 인구절벽인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그보다는 그 속도에 문제가 세계 유일무이할 정도로 가파르다는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이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조영태교수는 티비를 통해서도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알려온 사람이며 그가 진단하는 현재의 상황에 공감하고 의미 있는 지적이 많아 그의 인터뷰 전체를 공유하고 싶다.
“인구의 연관검색어는 저출산·고령화가 아닌 ‘미래’입니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50년 후에 현재 총인구의 70%가량인 15~64세 생산연령은 절반 아래로, 0~14세 인구는 6% 선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65세 이상 인구는 50
eiec.kdi.re.kr
위의 글 중에 그가 지적한 2016년도는 인구문제의 변곡점이 있는 해로써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을 통째 옮겨본다.
멜서스의 인구론에서는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밀도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밀도도 인구밀도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높아 성공에 대한 열망은 크고, 특히 청년들은 그에 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이 적다고 판단하는데, 그 판단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한다. 그런 와중에 SNS에 브이로그(vlog)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각자의 모습을 투영하게 됐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근에 더 하락한 원인으로 물리적 밀도 외에 SNS로부터 촉발된 심리적 밀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실제로 인구학자들이 SNS와 전 세계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처럼 타인을 의식하고 또 하나의 이슈에 전 국민이 함께 열광하는 심리가 매우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인구문제 그리고 저출산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생각엔 여지가 없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린가드 한국에 입성 (2) | 2024.02.04 |
|---|---|
| 명절선물세트 (상주곶감) (1) | 2024.02.02 |
| 원데이 클래스 체험 (10) | 2024.01.30 |
| 노시보(nocebo) 효과 (2) | 2024.01.30 |
| 절대온도, 섭씨온도, 화씨온도 (0) | 2024.01.26 |